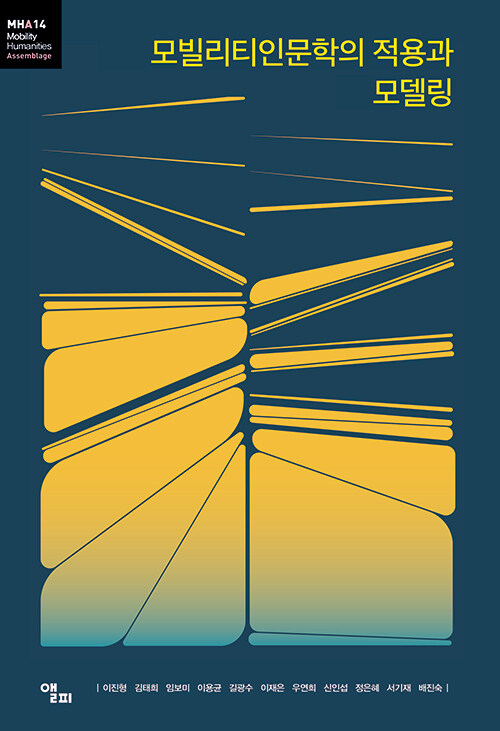텍스트 매개의 문화적/정치적/윤리적/감성적 모빌리티인문학 연구 모델
모빌리티인문학, 모빌리티 연구의 인문학적 전환
인간이 실천하고 경험하고 감각하는 모빌리티, 인간의 재현과 상상과 사유로써 문화적/정치적/윤리적/감성적으로 의미화되는 모빌리티를 고찰하는 ‘모빌리티인문학’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일종의 연구 모델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책이다. 텍스트를 매개로 한 모빌리티인문학은 특유의 인지적 활동을 통해 모빌리티의 복합적 의미화와 잠재적 모빌리티의 가시화에 참여한다. 이 책에서 모빌리티인문학이 적용된 분야는 철학과 법, 항공, 건축, 미디어, 문학, 의학교육, 이주 연구 등이다. 텍스트를 통한 재현과 상상과 사유는 어느 분과학문, 어떤 연구에도 무궁무진하게 변주될 수 있다. 이 책은 그 결합과 적용의 신호탄이자 모델링 사례이다.
인간과 동물, 인간과 미디어, 인간과 기계 …
‘대안 공통체’, ‘공간과 미디어’, ‘트랜스내셔널 스토리월드’의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8개 모빌리티 연구의 인문학적 전환 사례를 보여 준다. 1부 ‘대안 공동체’에서는 고-모빌리티 시대 대안적 공동체를 구상하기 위한 철학적 사유, 그리고 이동권에 기반한 인간과 동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정책적 제안을 시도한다. 2부 ‘공간과 미디어’에서는 2015년 ‘저먼윙스 9525편’ 항공사고를 대상으로 항공사고가 어떻게 미디어의 정치에 의해서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렘콜하스의 건축물 ‘보르도 하우스’를 대상으로 인간과 기계 또는 타자의 이동적 관계 맺기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탐구하며, 일본 소설가 오오카 쇼헤이의 작품 《구름의 초상》을 토대로 1950~70년대 일본 사회가 어떻게 모빌리티 인프라(텔레비전)를 매개로 구성되는지 논의한다. 3부 ‘트랜스내셔널 스토리월드’에서는 나혜석의 여행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근대 초기 글로벌 젠더 산책자 또는 젠더 모빌리티의 실천을 탐색하고, 일제강점기 일본 의사 집단의 한반도 이주 및 의학교육을 사례로 의료의 초국적 이동 현상을 고찰하는 한편, 최근 모빌리티 기술의 발달과 그를 활용한 친가족 찾기 현상을 분석한다.
잠재적 형태로 존재하는 수많은 이동적 관계와 모빌리티 정의
물론 모빌리티인문학의 역사가 짧은 만큼 그와 같은 연구 목적이 현재 양과 질 측면에서 충분히 성취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모빌리티인문학은 텍스트를 매개로 모빌리티와 관련한 문화적·정치적·윤리적·정신적·감성적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잠재적 형태로 존재하는 수많은 이동적 관계들에 대한 발굴 및 개방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미충족 상태는 가늠할 수 없는 모빌리티인문학의 연구 잠재력에 대한 표시일 수 있다. 새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사회 세계’를 “다양한 사람, 관념, 정보, 사물의 이동을 포함하고 유발하고 감소시키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실천, 인프라, 이데올로기의 거대한 집합”으로서 이론화하려는 시도라면, 모빌리티인문학은 텍스트를 매개로 그러한 이동을 둘러싼 관계들에 대한 문화적·정치적·윤리적·정신적·감성적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오직 잠재적 형태로만 존재하는 수많은 모빌리티들을 발굴해서 가시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정 분과학문이나 연구 방법론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모빌리티인문학은 궁극적으로 ‘모빌리티 정의’의 관점에서 미래 모빌리티 사회의 재구성에 기여하려는 목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