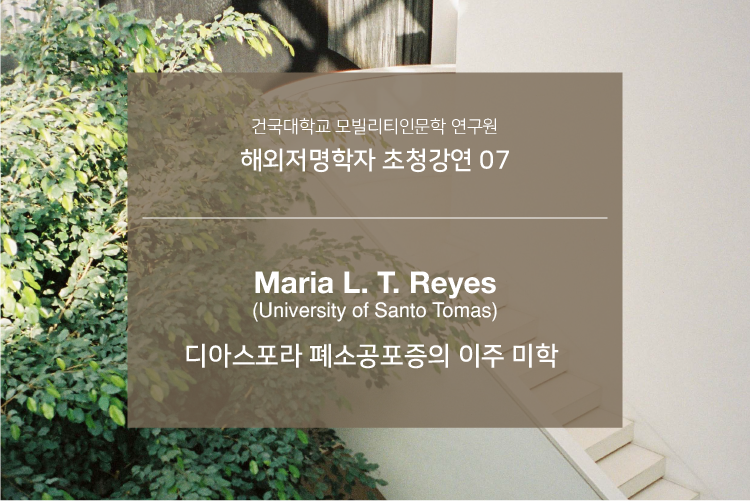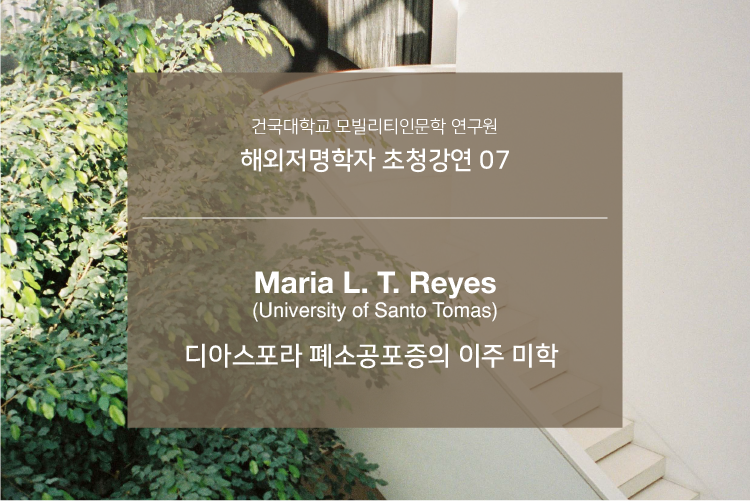
텍스트 및 맥락의 결정요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형식의 이동 과정은 텍스트 모빌리티와 이동적 텍스트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 역학관계는 모빌리티의 미학과 어떤 미학으로서의 모빌리티 표현을 형성하는, 사회적・정치적으로 굴절된 과정이다. 이 과정은 모순적이지만 서로 이(부)동화와 이동화를 구성하고, 그래서 지구화 시대 디아스포라 경험으로 인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어떤 미학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긴장 상태는 일차원적 과정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적 역동성, 말하자면 A 지점과 B 지점 사이―노마드적인 미학적 사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전치 행위를 논쟁, 저항, 공모, 의미 등의 역동적 현장으로 만드는 관계적 역동성이다. 이 공간에서 필리핀 단편소설 <안녕, 또 만나세Arrivederci>는 이동성과 부동성 사이에 기입되어 있는 긴장을 다룬다. 여기에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삶에 주목한 ‘이주’ 미학이 놓여 있다. 이탈리아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은 객체화된 이주 상품으로서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거리distances를 항해하고 이동성과 부동성의 밀고 당기기를 경험한다. <안녕, 또 만나세Arrivederci>는 그런 이주노동자들의 경험을 주제로서 재기입하고 있다. 이는 ‘디아스포라 폐소공포증’이라고 부를 수 있다.